
1. 책소개
일반적으로 ‘정사(正史)’란 특정한 왕조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들을 말한다. 단순히 왕조의 역사를 기록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후세 사람들로부터 그 내용의 공신력을 인정받은 역사서들을 가리킨다. 중국에서 정사는 삼황오제(三皇五帝)로부터 한나라 무제(武帝)까지의 역사를 다룬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를 위시하여 청나라의 정사인 《청사고(淸史稿)》까지 총 25종이 있다. 그러면 중국 사람도 아닌 우리가 왜 남의 나라의 정사에 주목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조선전(朝鮮傳)” 또는 “동이전(東夷傳)”이라는 이름의 매개체를 통하여 ‘타자(他者)’의 눈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다.
《사기》의 〈조선열전(朝鮮列傳)〉은 아주 간략하게 작성되어 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는 분량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파편화된 언어와 맥락들 속에서 위만(衛滿) 이전의 고조선의 연혁과 위치, 위만 당시의 고조선의 강역, 그 손자인 우거(右渠)가 항전을 벌였던 왕험성(王險城)과 패수(浿水)가 자리잡았던 공간의 지형, 나아가 그 뒤에 설치된 ‘한 사군(漢四郡)’의 좌표까지 시뮬레이션해 볼 수가 있다. 이렇듯, 중국 정사 원전만 제대로 이해하기만 해도 그동안 우리 뇌리에서 잊혀져 있던 역사적 진실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2천여 년 전의 한대부터 고조선·삼한 등 우리의 역사와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중국의 정사는 사실상 우리 고대사의 연구, 역사지리 고증, 고대어 발굴 등 역사적 진실의 재발견에 대단히 중요한 참조자료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정역 중국정사 조선.동이전1》은 중국정사 25종 가운데 가장 먼저 씌어진 〈사기〉〈한서〉〈삼국지〉〈후한서〉의 조선열전, 조선전, 동이전, 동이열전의 원문을 번역하고, 이에 대한 중국역대 학자들의 주석을 모두 아울러 번역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한국인 학자의 입장에서 역자의 주석을 달았다. 앞으로도 이 작업은 25사 전부를 대상으로 지속될 예정이다.
이 책을 통하여 고대사 자료가 부족한 한국사 입장에서는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특히 기존의 중국정사 역주본들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작업(잘못된 원전해석, 오독, 오기 등)을 행함으로써 이후 중국정사 번역에 대한 국사학계의 자성과 시정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이 책의 역자는 초기 중국 정사이자 고대사 연구의 필독서인 ‘전 4사’의 〈조선전〉과 〈동이전〉, 그리고 한대로부터 청대까지 역대 중국 학자들이 붙인 주석들을 몇 번이나 정독하고 분석한 결과 조선의 반도사관의 영향을 받은 청대 학자들의 주석들을 제외한 중국의 역대 역사가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요동, 즉 지금의 하북성 동북부와 요서지역에서 고조선 중심지의 좌표를 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는 ‘고조선의 왕험성 또는 고구려의 평양성이 요동에 있었고, 패수가 한반도의 청천강이 아니라 동쪽으로 흘러 동쪽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이라는 사실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뜻이다.
이 책은 우리 역사의 시원과 실상이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대륙에 있었음을 중국인의 역사기록과 중국 당대학자들의 주석연구를 통해 밝혀내고 있다!!!
출처:교보문고
2. 저자
저자: 문성재(文盛哉)
우리역사연구재단 책임연구원.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중국 남경대학교에서 문학박사를, 서울대학교에서 언어학박사를 받았다.역저서에 《고우영 일지매》(중역서), 《중국고전희곡10선》(역서), 《진시황은 몽골어를 하는 여진족이었다》(역서), 《조선사연구》(역서), 《한국의 전통연희》(중역서), 《처음부터 새로읽는 노자 도덕경》(역서), 《한사군은 중국에 있었다》(저서), 《한국고대사와 한중일의 역사왜곡》(저서) 등이 있다.
출처:교보문고
3. 목차
〈우리국학총서〉를 펴내며
여는 글
사기-조선열전
조선열전(朝鮮列傳)
한서-조선전
조선전(朝鮮傳)
삼국지-위지ㆍ동이전
동이전(東夷傳) 서(序)
부여전(夫餘傳)
고구려전(高句麗傳)
동옥저전(東沃沮傳)
읍루전(?婁傳)
예전(濊傳)
한전(韓傳)
마한(馬韓)
진한(辰韓)
변진(弁辰)
후한서-동이열전
동이열전(東夷列傳) 서(序)
부여전(夫餘傳)
읍루전(?婁傳)
고구려전(高句驪傳)
구려전(句驪傳)
동옥저전(東沃沮傳)
예전(濊傳)
삼한전(三韓傳)
찾아보기
출처:본문중에서
4. 책속으로
[이 책의 《사기》〈조선열전〉에 나오는 한국고대사 쟁점용어]
조선왕(朝鮮王), 만자(滿者), 연인(燕人), 진번(眞番), 요동(遼東), 패수(浿水), 흉노(匈奴), 왕험성(王險城), 임둔(臨屯), (한漢)사군(四郡).
[역자의 주석注釋 보기]
011 원문번역(〈사기〉 조선열전) :
좌장군은 [좌장군대로] 조선의 패수 서쪽의 군대59)를 쳤으나 [그때까지도 제대로] 무찌르고 전진할 수가 없었다.
주석 59)
-----〈조선열전〉에 묘사된 왕험성과 지리적으로 가장 유사한 입지조건을 가진 것은 지금의 중국 하북성 동북부 산해관(山海關) 남쪽의 창려현(昌黎縣) 인근 정도이다.
019 원문번역(〈사기〉 조선열전) :
원봉(元封) 3년(BC108) 여름이 되자, 니계의 상인 참은 곧바로 사람을 보
내 조선의 왕 우거를 시해하고 [한나라 군영으로] 와서 항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험성은 함락되지 않았으며73)
주석 73)
고조선이 멸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5만이 넘는 한나라 원정군과 전쟁에서의 패배가 아니라 고조선 지배층 내부에서의 분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를 근거로 내부분열로 시해당하기 전까지 우거가 한나라와의 전쟁에서 끝까지 농성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왕험성이 평지가 아니라 높고 험한 산지에 기대어 구축된 철옹성이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5만이 넘는 한나라 원정군이 1년 동안 왕험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채 전전긍긍한 것이 그 방증이다. 한나라 군사가 왕험성을 포위할 때 동서남북 사방이 아니라 서쪽과 북쪽만 포위한 일 역시 그 증거이다. 왕험성이 평지에 있었다면 한나라 군사와 지구전을 벌일 틈도 없이 전쟁에서 참패해 버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고조선의 왕험성은 그 지리적 입지조건만 따져 보더라도 지금의 평양시와 같은 곳일 수 없는 것이다.
주석 89)---〈사기〉조선열전
89) 【索隱】 蘇林曰, 縣名. 度海先得之.열수 어귀[洌口]는 누선장군 양복이 수군을 거느리고 도착한 조선의 땅이며 한사
군이 설치된 뒤에 ‘열구현(洌口縣)’이 되었다. 《한서》에는 ‘벌일 열(列)’을 써서 ‘열구(列口)’로 나와 있다. 원문의 ‘열구(洌口 또는 列口)’는 ‘열수(洌水 또는 列水)의 어귀’라는 뜻이다. 양복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이 열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어귀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 열수 어귀를 거슬러 올라가면 자연히 우거의 왕험성이 자리잡고 있었을 것이다. 《동북아판》(제029쪽)에 따르면 서영수는 선진 문헌에 등장하는 열수는 고조선이 요동에 있을 때의 요하이고 이 시기의 열수는 평양의 대동강이라고 본 것 같다. 그러나 고조선의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한 것은 고구려 때이다. 적어도 사료상으로는 그 이전에 중심이 요동에서 한반도로 이동했다는 가설을 뒷받침해 줄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요동’의 지리개념 역시 현재와는 달리 지금의 요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리개념이었기 때문에 조선-요동-패수-열수의 좌표는 신중하게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진대(晉代) 초기의 학자 곽박(郭璞, 276~324)은 전한의 언어학자 양웅(揚雄, BC53~AD18)이 저술한 방언집인 《방언(方言)》의 “조선열수 일대[朝鮮洌水之間]” 대목에서 “열수는 그 이름이 요동에 보인다.(列水名在遼東.)”라고 주석을 붙인 바 있다. 이로써 열수의 좌표가 전한대만 해도 요동[군] 땅에 있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누선장군 양복이 도착한 조선의 왕험성은 지금의 평양시가
아니라 중국의 요동(지금의 요서)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는 뜻이다. 《국편위판》(제47쪽 주48)에서는 곽박이 언급한 ‘요동’을 지금의 요동반도 일대로 이해하여 “열수가 요하이며 열구는 발해로 요하가 유입하는 지역”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요동’을 요동반도 일대로 한정시키는 것은 100여 년 전의 근대의 지리인식에 익숙해진 데에 따른 착시의 결과이다. 한나라의 조선 정벌이 일어났던 2,000년 전은 물론이고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인 명·청대만 하더라도 ‘요동’은 요동반도는 물론 지금의 산해관(山海關) 이동으로부터 요하 이서까지의 요서(遼西)지역까지 아우르는 좀 더 넓은 지리개념이었기 때문이다.
원문번역(〈후한서〉동이열전 고구려전)
---마한·예·맥의 기병 수천 기를 거느리고[率馬韓·濊·貊數千騎]:
주석 175)
이병도는 고구려의 태조왕이 재위 69년 12월부터 70년 2월까지 현토군을 공략할 때 예맥은 물론 마한과도 연합한 일을 두고 “政治上·地理上으로 高句麗와 馬韓은 南北으로 隔絶한 관계에 있어 여기에 나오는 馬韓은 誤傳”(《역주 삼국사기》, 제243쪽)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 같은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마한이 고구려와 남북으로 격절되어 왕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고구려와 마한이 한반도 안에 있었다는 반도사관에 근거한 추론이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 다소 늦기는 하지만 당대 초기인 6세기에 편찬된 《양서(梁書)》나 《남사》의 〈동이전·한전〉에서는 마한의 위치와 관련하여 “위나라 때 조선 이동지역의 마한이나 진한 같은 족속들은 대대로 중국과 내왕하였다.(魏時, 朝鮮以東馬韓辰韓之屬, 世通中國.)”라고 소개한 바 있다. 위나라 때라면 3세기이므로 위만조선이 멸망한 뒤이지만, ‘조선’이라는 이름은 당시까지도 일종의 지역명으로 그대로 통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① 두 정사의 편찬자가 마한과 진한의 위치를 “조선 이동지역”이라고 명시했다는 사실이다. 국내·외 학계에서는 그동안 조선의 중심지를 평양시 일대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북부에, 마한·진한 등 ‘삼한’을 충청·경상·전라 세 지역에 각각 비정해 왔다. 만약 조선의 좌표를 평양시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북부에 놓을 경우, 마한과 진한의 자리는 학계의 주장과는 달리 함경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충청·경상·전라 세 지역도 그렇지만 함경도·강원도만으로는 ‘삼한’의 그 수많은 나라들이 자리 잡기에 너무도 비좁다. 두 지역의 상당한 면적을 사람이 살기 힘든 고산지대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애초부터 좌표가 잘못 설정된 것이다. ② “마한[사람들]은 산과 바다 사이에 분포한다.(馬韓居山海之間.)”라고 한 《진서》〈동이전·한전〉의 기사 역시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만약 학계의 기존 고증을 관철시키자면 《진서》의 이 기사도 뜯어 고쳐야 된다는 말이 된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위로는 고도가 높은 산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래에는 발해 바다가 자리 잡고 있어서 예로부터 “산과 바다 사이[山海之間]”라는 비유가 관용적으로 사용될 정도로 독특한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해관(山海關)’이라는 지명이 바로 그 이동지역의 이 같은 지형적 특징에서 비롯된 것임은 물론이다. 만약 마한[과 고구려]의 좌표를 한반도에서 지금의 요서지역으로 옮겨 놓으면 《후한서》〈안제기〉나 《진서》·《량서》·《남사》의 〈한전〉의 기사는 전혀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 경우 조선(낙랑)의 동쪽에 마한이 있고, 마한의 서북쪽에 고구려가 있는 셈이어서 고구려와 마한의 연합이 지리적·역사적·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부합되기 때문이다. ‘삼한’의 자리를 요령지역으로 설정할 경우 80개 가까운 크고 작은 나라들이 존재했다는 기술 내용 역시 그다지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게 된다. ③ 《구당서》〈백제전〉에서 “백제국도 본래는 부여의 또 다른 갈래로, 예전에는 마한의 옛 땅이었다. 도읍에서 동쪽으로 6,200리 지점에 있다.(百濟國, 本亦扶餘之?種, 嘗爲馬韓故地, 在京師東六千二百里.)”라고 한 것 역시 또 다른 의미 있는 근거이다. 한대의 학자로 알려져 있는 신찬(臣瓚)은 《한서》〈무제기(武帝紀)〉에서 임둔군과 진번군의 위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석을 붙인 바 있다. “《무릉서》에서는 ‘임둔군의 치소인 동이현은 장안으로부터 6,138리 거리로, 15개 현을 거느리고 있으며, 진번군의 치소인 삽현은 장안으로부터 7,640리 거리로, 15개 현을 거느리고 있다.’라고 하였다.(茂陵書臨屯郡治東?縣, 去長安六千一百三十八里, 十五縣. ?番郡治?縣, 去長安七千六百四十里, 十五縣.)” 만약 한 무제 당시에 지어진 것으로 전해지는 《무릉서》가 위작이 아니며 신찬의 주석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임둔군의 치소 동이현이 전한대 초기에 장안(지금의 서안시)으로부터 6,138리 떨어져 있었다는 말이 된다. 만약 동이현의 좌표를 2014~2017년에 ‘임둔태수장’ 봉니와 한대 토성이 발견된 요령성 태집둔 소황지촌에 둘 경우, 당나라 초기에 역시 장안으로부터 6,200리 떨어져 있었다는 백제의 좌표 역시 소황지촌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백제가 마한의 옛 땅에서 건국되었다고 했으므로 마한의 좌표 역시 자연히 그 주변에서 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출처:본문중에서
쿠팡 최저가 + 선물증정 바로가기-> https://link.coupang.com/a/kcywx
정역 중국정사 조선 동이전 1-2 (전2권) 세트 +미니수첩제공
COUPANG
www.coupang.com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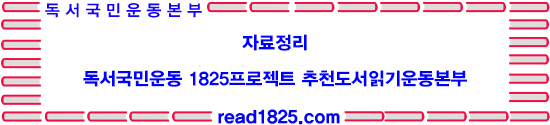
'2022년 추천도서(22.3~23.2) > 2022-3' 카테고리의 다른 글
| 3월의 추천도서 (3291) 2035 SF 미스터리 (0) | 2022.03.06 |
|---|---|
| 3월의 추천도서 (3290) 부모와 다른 아이들1, 2 (0) | 2022.03.05 |
| 3월의 추천도서 (3289) 만들어진 유대인 (0) | 2022.03.04 |
| 3월의 추천도서 (3287) 마담 보바리 (0) | 2022.03.02 |
| 3월의 추천도서 (3286) 대한제국과 3·1운동 (0) | 2022.03.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