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책소개
국어학계의 혁신적 연구자 정광 교수가 풀어낸 국내 최초 〈조선가〉 연구서
피랍 조선인의 삶을 통해 조망하는 새로운 한일 관계사
‘도자기전쟁’이라 불린 임진왜란에서 잡혀간 조선 도공들의 잊혔던 역사를 생생히 되살려낸 획기적 연구서. 〈조선가〉는 피랍 조선 도공들이 가고시마 지방에 정착해 대를 이어 불렀던 망향의 노래다. 국어학계의 원로 정광 교수가 탁월한 언어학적 조예를 바탕으로 〈조선가〉의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국내 최초로 〈조선가〉를 현대 우리말로 완역해 올바른 풀이를 달고, 한일 양국의 사료를 빠짐없이 분석, 피랍 조선 도공들의 기록을 낱낱이 복원했다. 일본의 도자기 문화를 융성케 한 조선 도공들이 일본 사회에 미친 문화경제적 영향력을 따져보고, 나아가 발전적인 한일 관계의 실마리를 모색한다.
출처:교보문고
2. 저자
저자 : 정광
세계 언어학계가 인정하고 경의를 표하는 정광 교수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사역원 역학서의 표기법 연구〉로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사역원 왜학 연구〉로 국민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어학 분야 제1호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명예교수로 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객원교수, 일본 교토대학교 초빙 외국인 학자, 일본 동경외국어대학교 초청교수, 일본 간사이대학교 초청연구원, 일본 와세다대학교 교환연구원,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언어학과 강의 초청, 중국 북경중앙민족대학교 초빙강사 등 해외에서도 활발한 강의와 연구 활동을 해왔다. 한국어학회, 한국이중언어학회, 국어사자료학회, 한국알타이학회, 한국구결학회 등의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국제역학서학회, 국제고려학회(ISKS) 회장을 거쳐 현재 고문으로 있다.
저서로 《한글의 발명》 《조선시대의 외국어 교육》 《동아시아 여러 문자와 한글》 《훈민정음과 파스파 문자》 《삼국시대 한반도의 언어연구》 《노박집람역주》 《몽고자운연구》 《역주 원본노걸대》 《역학서의 세계》 등 다수가 있다. 중국어 및 일본어로 출간한 《蒙古字韻 硏究》 《朝鮮吏讀辭典》 《老乞大: 朝鮮中世の中國語會話讀本》 《原本老乞大》 《原刊老乞大硏究》 등으로 전 세계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출처:교보문고
3. 목차
권두언
1장 들어가기
2장 교토대학에 소장된 〈조선가〉
1. 〈조선가〉 연구 자료
2. 나에시로가와 피랍인 연구 자료
3장 사쓰마의 피랍 조선인
1. 임진왜란·정유재란에서 납치된 조선인
2. 피랍된 조선인 수효
3. 왜군은 왜 조선인을 납치했을까?
4. 피랍인의 쇄환과 사쓰마의 피랍 조선인
5. 쇄환에 응하지 못한 조선 피랍인
4장 사쓰마의 고려인 마을
1. 고려인 마을의 유래
2. 도자기 제작
3. 나에시로가와 정착
5장 피랍 조선인과 그 후예의 생활
1. 나에시로가와에서의 생활
2. 조선인의 씨명
3. 조선어 통사와 조선어 학습
4. 조선인의 표착과 통사 역할
5. 피랍 조선인의 명칭 호고려인
6장 〈조선가〉와 〈학구무의 노래〉
1. 〈조선가〉는 무엇인가?
2. 옥산묘의 〈신무가〉
3. 〈신무가〉의 가사
4. 〈학구무의 노래〉
7장 조선 전기의 가요 〈조선가〉
1. 안상 《금합자보》
2. 《양금신보》의 속칭 〈심방곡〉
3. 〈조선가〉의 제1연과 《금합자보》의 〈오??리〉
4. 〈조선가〉의 나머지 구
5. 가나 표기에 보이는 문제점
6. 한자 표기
8장 맺음말
한국어판을 내면서
찾아보기
출처:본문중에서
4. 책속으로
조선시대 후기의 문화가 전기에 비해 훨씬 침체되었던 것은 이러한 인적 자원의 손실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며 얻은 인적 자원으로 여러 부문, 특히 도자기와 활자 인쇄술, 건축 기술, 철기 제조 등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근대화의 기초를 다졌다. 본서에서 다룬 도자기에 관한 것만을 보더라도 임진왜란 때 납치해간 도공들이 발전시킨 일본 도자기가 서양에 알려져 대량 수출되며 많은 자금을 벌어들였다. 이렇게 벌어들인 자본이 바로 일본의 근대화를 촉진하는 밑천이 된 것으로 필자는 본다. (p.14)
교토대학 문학부 언어학연구실에 소장되어 있는 나에시로가와 전래의 조선어 학습 자료 중에 〈조선가〉라고 제목을 붙인 한 책의 필사본이 있다. 이 책에는 조선 이두식 표기법을 혼합하여 한자로 쓴 4연의 가요가 있고 각 구의 왼쪽에는 언문, 오른쪽에는 가타카나로 조선어가 표기되어 있다. (p.21)
사쓰마의 피랍 조선인의 수효는 전게한 시마즈 마타하치로의 도해면허에 나와 있는 분로쿠 4년(1595) 4월 16일에 납치된 24명과 《성향집》에 기록되어 있는 100여 명, 그리고 게이초 3년(1598) 말에 시마즈군이 철수할 때 연행한 80여 명, 합 200여 명만이 기록에 남아 있다. 이 중에 일부는 쇄환되었지만 남은 포로는 나에시로가와에 옮겨져 그곳에서 영주하게 된다. 밤에 바다로 나아가서 귀국하려고 몰래 배를 띄우려 했지만 모두 사쓰마 영주의 철저한 감시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처지를 한탄하며 산에 올라 고국을 향하여 망향의 노래를 목이 터져라 부를 수밖에 없었다. (p.101)
왜란 때에 조선 남원에서 시마즈군에 납치되어 사쓰마의 나에시로가와에 억류된 도공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임진왜란ㆍ정유재란 때에 시마즈군에 납치되어 끌려온 조선인들은 시마즈 요시히로의 영지인 사쓰마 나에시로가와에 정주했으며 그들은 황무지였던 이곳을 일본 제일의 도향(陶鄕)으로 발전시켰다. 이곳은 일본에서 ‘고려인 마을〔高麗人村〕’로 불리는 도자기 마을로 알려져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리고 일본의 저명한 역사소설가 시바 료타로의 《고향을 잊기 어렵습니다(故?忘じがたく候)》로 인해 왜란에 납치된 조선인들의 정착지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p.105)
역대 사쓰마의 한슈 중에서는 시마즈 미쓰히사가 조선의 풍물, 습관, 도자기에 가장 많은 이국 취미로서의 애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에시로가와의 조선인 후손에 대해 보호정책을 폈고 그로 인해 나에시로가와는 최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나에시로가와의 피랍 조선인 후예들은 사쓰마의 역대 한슈로부터 우대를 받았고 그중 일부는 나중에 신분상의 특별한 대우를 받아 대대로 후치마이(녹봉)를 하사받았다. (p.141)
일본에 납치된 조선인들은 자신들의 조선 문화에 대하여 상당한 긍지를 지닌 것으로 보이고 조선에서 유행한 시조 형식으로 자신들의 감정을 노래한 것이다. 시문의 내용으로 보아 언문을 많이 써보아서 익숙하고 시조의 형식도 잘 갖추어졌다. 특히 피랍 조선인들은 일본인이 알지 못하는 언문(諺文)으로 무엇인가를 쓸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 차완에 이러한 시문을 써서 일본인 몰래 자신들의 설움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p.191)
조선 남원에서 간행된 《양금신보》에 실린 〈오??리〉는 정유재란 당시 남원이 함락되었을 때에 이곳을 침공한 왜군의 시마즈군에 납치되어 사쓰마에 끌려간 도공들이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부르던 노래였다. 그리고 자연히 그의 후예들도 이 노래를 망향가로서, 그리고 평화를 갈구하고 전쟁을 혐오하는 반전의 노래로서 대를 이어 부르게 된 것이다. (p.252)
출처:본문중에서
5. 출판사서평
피랍 조선 도공들이 일본 가고시마에서 부르던
한의 노래 〈조선가〉를 찾아서
조선인과 그 후손들이 부르던 〈조선가〉는 왜 우리 역사에서 사라졌는가?
고국에서 잊혔던 피랍 조선인의 삶을 생생히 복원한 역작
‘도자기전쟁’으로도 불리며 수많은 조선 도공(陶工)들이 일본으로 납치된 임진왜란. 피랍된 그들은 백자(白磁) 제작에 동원되어 일본 가고시마 나에시로가와에 정착해 도자기 마을을 이루었다. 망향(望鄕), 그들의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은 하나의 노래가 되어 자자손손 전해지게 된다. 바로 〈조선가〉이다. 그동안 한국에는 알려지지 않고 일본에서만 간헐적인 연구가 있었던 이 사료를 1980년 교토대학교 서고에서 최초로 발견한 것은 한국의 국어학자 정광 교수였다.
탁월한 언어학적 조예와 역사에 대한 독보적인 안목으로 국어학계의 혁신적 연구자로 평가받는 정광 교수. 그는 국내외 사료를 끈질기고 치밀하게 검증한 끝에 〈조선가〉가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서 유행하던 가요였음을 확인한다. 이는 피랍 조선인들이 타향에서도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일본 사회에 문화적 영향력을 남겼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다. 1990년 정광 교수가 일본에서 출간한 《사쓰마 나에시로가와에 전래된 조선가요(薩摩苗代川傳來の朝鮮歌謠)》는 〈조선가〉의 뿌리를 밝히고 임진왜란의 실상을 일본 사회에 알린 연구서다. 이 책을 한국어판으로 편집한 《조선가》를 이제 한국 독자에게도 선보인다. 최초 우리말 완역 〈조선가〉 전문에 원로 국어학자의 깊이 있는 해설을 더했다.
《조선가》는 피랍 조선 도공들의 기록을 생생히 복원하고, 그들이 일본 사회에 미친 사회 경제적 영향력을 분석한다. 한일 두 나라의 방대한 사료를 소개하며 조선 도공들의 피랍 및 일본 정착 과정을 낱낱이 서술한다. 피랍 조선인과 후예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망향의 그리움을 생생히 묘사하고, 그들이 일본 사회에 끼친 막대한 영향력을 확인한다. 새로운 시각의 한일 관계사 모색의 초석이 되어줄 귀중한 저작이다.
우리 역사의 잃어버린 연결고리 〈조선가〉
한일 관계사를 새롭게 재정립할 획기적 연구서
잃어버린 역사 〈조선가〉 원전 최초 완벽 해설
〈조선가〉는 조선시대 중인(中人)이 썼던 이문(吏文)의 흔적이 남아 있고 당시의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어 언어학적으로 귀중한 사료다. 정광 교수는 〈조선가〉가 조선 중기 남원 지방에서 간행된 《양금신보(梁琴新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밝혀냈다. 나에시로가와 지방에 정착한 도공들의 출신지가 남원이었음을 확인해주는 일본 사료도 있었다.
정광 교수는 이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본 학자들의 해석을 바로잡고, 〈조선가〉 가사의 본래 의미를 완벽하게 복원해냈다.
〈조선가〉의 첫 구절에 적힌 ‘오늘이 오늘과 같으면’이라는 가사는 매일 오늘과 같은 평화로운 날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광 교수는 이 노래가 피랍 조선인들의 가슴에 정말로 와닿았으리라 짐작한다. 전쟁의 참화에 희생된 조선인들은 무엇보다도 평화와 반전(反戰)을 기원했을 것이다.
조선 도공들이 일본 사회에 미친 사회 경제적 영향력 심층 분석
《조선가》는 일본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조선 도공들을 집중 조명한다. 정유재란에 남원에서 피랍된 박평의(朴平意)는 명품 도자기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사쓰마도기(薩摩き)의 시조 격으로 추앙받는다. 지금도 나에시로가와에는 ‘사쓰마도기 시조 박평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박평의와 함께 붙잡혀 온 심당길(沈當吉) 가문 역시 대대로 심수관(沈壽官)이라는 습명(襲名)을 이어오며 지금까지도 도예를 가업으로 삼고 있다.
황무지였던 사쓰마 나에시로가와는 도자기마을이 생긴 뒤 크게 발전했다. 조선 도공들은 농작물 대신 도자기를 영주에게 공납(貢納)으로 바쳤고, 이는 사쓰마 지방의 경제력에 큰 기여를 했다. 주변의 일본인 마을보다 부유해진 탓에 시기와 배척을 받기도 했으나, 영주들은 조선인들에게 향사(鄕士) 직위를 내려 사무라이 계급과 같은 대우를 하기도 했다.
박평의는 나에시로가와로 이주한 게이초 8년에 세이자에몬이라는 이름을 하사받고 나에시로가와의 쇼야, 즉 촌장으로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게이초 19년에 백토 등을 발견하고 백자를 만들어 또다시 촌장으로 임명받았으며 후치마이(扶持米, 녹봉)로서 녹미 4석을 하사받은 것에 대해서는 앞서 지적한 대로이다. (p.122)
일본은 피랍 조선인들에게 다양한 공무를 맡기기도 했다. 조선인들은 주로 ‘통사(通辭)’의 역할을 맡아 해상 사고로 인해 일본으로 표류한 조선인들을 도왔고, 그 대가로 일본 관청은 녹봉을 제공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영주의 가신(家臣)으로 삼아 영지와 소, 말 등 재산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기기기도 하였다. 애초에 전쟁 포로로 일본에 잡혀온 조선인으로서는 파격적인 대우였다.
사쓰마의 조선 통사는 이 마을 사람이 맡아서 한다. 이 마을에서 평소에는 대부분 일본어에 익숙해져 있다고는 하나 또한 자주 조선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통사의 소임을 맡은 것이다. 예로부터 사쓰마는 다른 나라의 배가 매번 표착(漂着)해 오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통사 소임을 맡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마을 사람이 조선 통사를 맡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p.155)
나에시로가와의 조선인 후손에 깊은 관심을 보이던 사쓰마 영주 시마즈 미쓰히사는 도업을 장려하기 위해 사쓰마의 독특한 향역인(?役人) 제도를 적용해 각종 관리를 마련하여 임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에시로가와의 피랍 조선인 후예들은 사쓰마의 역대 영주로부터 우대를 받았고 그중 일부는 나중에 신분상의 특별한 대우를 받아 대대로 녹봉을 하사받았다. (p.141)
일본 근대화의 근저를 밝히며 새로 쓰는 한일 관계사
조선 도공이 백자 제조 기술을 전한 뒤 일본 도자기 산업은 폭발적으로 발전했다. 왜란이 끝나고 50년 뒤인 1650년, 처음으로 네덜란드 상선에 실려 유럽으로 갔던 일본의 도자기는 100여 개였으나 몇 년 지나지 않아 해마다 5만 개씩 수출됐다. 첫 수출 이후 70년 동안 약 700만 개가 세계 각지로 팔려나갔다.
《조선가》는 조선 도공이 촉발한 도자기 산업의 발전이 일본 근대사에 미친 영향에 주목한다. 정광 교수는 이때 축적한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일본이 근대화에 이를 수 있었다고 본다. 조선 도공들이 집중적으로 정착했던 사쓰마 지방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메이지유신(明治維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가 한국의 근대화를 이뤘다는 식민지근대화론에 통쾌한 반격을 날리는 주장이다.
조선시대 후기의 문화가 전기에 비해 훨씬 침체되었던 것은 이러한 인적 자원의 손실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며 얻은 인적 자원으로 여러 부문, 특히 도자기와 활자 인쇄술, 건축 기술, 철기 제조 등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근대화의 기초를 다졌다. 본서에서 다룬 도자기에 관한 것만을 보더라도 임진왜란 때 납치해간 도공들이 발전시킨 일본 도자기가 서양에 알려져 대량 수출되며 많은 자금을 벌어들였다. 이렇게 벌어들인 자본이 바로 일본의 근대화를 촉진하는 밑천이 된 것으로 필자는 본다. (p.14)
저자의 말처럼 이 책 《조선가》는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도공들과 그 후예들이 대대로 불렀던 망향과 반전의 노래 〈조선가〉에 관한 종합적 연구이면서, 동시에 역사적으로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어온 한국과 일본의 관계사적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우리 역사의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다시 메우는 《조선가》가 선조들의 아픔과 그리움을 되살리고 나아가 한일 관계사에 발전적 영향을 주기를 기대한다.
출처:김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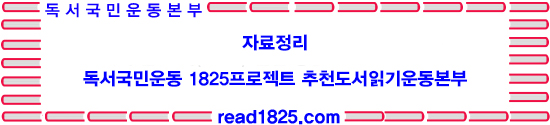
'2020년 추천 도서(20.3~21.2)' 카테고리의 다른 글
| 9월의 추천도서(2758) 소유와 자유 (0) | 2020.09.19 |
|---|---|
| 9월의 추천도서(2757) 셸리 산문집 (0) | 2020.09.18 |
| 9월의 추천도서(2755) 선교사의 여행 (1) | 2020.09.16 |
| 9월의 추천도서(2753) 예술가의 편지 (0) | 2020.09.14 |
| 9월의 추천도서(2752) 지례의 추억 (1) | 2020.09.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