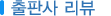8월의 추천 도서(1643) 테아이테토스- 플라톤
‘앎’이란 무엇인가?
《테아이테토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한 인식론 텍스트 가운데 하나이다. 이 텍스트는 ‘앎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중단 없이 일관되게 탐문하며, 이런 점에서 플라톤의 대화편 가운데 가장 명확하고 단일한 주제로 묶인 책이다. 그러나 《테아이테토스》는 아주 난해하기로 악명이 높다. 이를테면 19세기 영국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어려서부터 플라톤의 대화편을 통해 지적 훈련을 받았음에도 플라톤의 《테아이테토스》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불평을 자서전에 남기고 있다. 그럼에도 《테아이테토스》는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많은 작품이다. 논의의 다양함과 예리함, 그리고 독창성의 측면에서 독자의 끝없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인식론 텍스트로 《테아이테토스》에 버금가는 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테아이테토스》는 철학의 역사에서 최초로 상대주의를 예리하게 비판하는 논증을 제시한 것으로 이름이 나 있다. 또한 인간의 사유를 ‘밀랍 서판’에 빗대는 비유 등 흥미롭고 매력적인 여러 비유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 또한 독자의 지적 호기심을 한없이 자극한다. 그런가 하면 소크라테스를 ‘산파’(maia)에 빗대는 ‘산파의 비유’는 너무도 유명해서 교육철학의 식탁에는 지금도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논의의 잔치 음식이 되고 있다. 그 밖에 철학의 시작을 ‘놀라워하는 것’(thaumazein)에서 찾는 유명한 글귀가 등장하는 것도 《테아이테토스》이고, 탈레스가 우물에 빠진 이야기의 출처 또한 《테아이테토스》이다.
《테아이테토스》에 대한 연구자들의 입장은 예나 지금이나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의 갈림길이 플라톤에 대한 이해를 다르게 만든다. 그런 점에서 플라톤 철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꿈꾸는 독자라면 《테아이테토스》를 반드시 읽을 필요가 있다. 《테아이테토스》의 논의는 산파술로 진행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아서는 좇아가기가 어려운 텍스트이다. 그러나 그 같은 논의 방식 때문에 길어내고 길어 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깊은 통찰을 품고 있는 텍스트이기도 하다. 대화편 내에서 소크라테스와 테아이테토스가 나누는 대화의 열정과 진지함은 독자로 하여금 감동과 경외의 느낌마저 들게 한다. 우리는 이런 대화의 논의를 통해서 소크라테스적인 정신과 플라톤적인 정신이 《테아이테토스》에서 어떻게 만나는가를 체험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암학당 플라톤 전집’을 펴내며
작품해설
작품개요
등장인물
본문과 주석
부록
옮긴이의 글
참고 문헌
찾아보기
【작품 개요】
A. 도입부의 액자 이야기(142a-143c)
(등장인물: 에우클레이데스, 테릅시온)
B. 액자 내부의 본 이야기(143d-210c)
(등장인물: 소크라테스, 테아이테토스, 테오도로스)
0. 예비적 논의(143d-151d)
(1) 액자 내부의 도입부(143d-145c)
(2) 앎에 대한 예비적 정의의 시도와 이에 대한 비판(145c-148e)
(3) 산파의 비유(148e-151d)
1. 앎에 대한 첫 번째 정의 : 앎은 지각이다.(151d-186e)
(1) 테아이테토스의 첫 번째 정의와 프로타고라스의 인간척도설의 도입(151d-152c)
(2) 비교(秘敎)로서의 프로타고라스의 학설(152c-160e)
1) 헤라클레이토스적 학설의 소개 및 예비적 정당화(152e-153d)
2) 헤라클레이토스적 학설이 함축하는 놀라운 측면들(153d-155c)
3) 헤라클레이토스적 지각설의 체계적 적용(155c-157c)
4) 예비적 비판을 통한 헤라클레이토스적 지각설의 극단화(157c-160e)
(3) 프로타고라스를 곱씹어 보기(160e-168c)
1) 프로타고라스에 대한 예비적인 문제제기(160e-163a)
2) 프로타고라스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변호 논변(163a-168c)
(4) 프로타고라스에 대한 첫 번째 실질적 비판(168c-171d)
: 프로타고라스에 대한 변증적(대화적) 자기 논박
(5) 정의(正義)의 문제와 관련해서 변형된 프로타고라스주의(171e-172b)
(6) 여담(곁가지 이야기)(172c-177b)
: 연설가의 삶과 철학자의 삶의 대조
(7) 프로타고라스에 대한 두 번째 실질적 비판(177b-179b)
(8)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유전설에 대한 비판(179c-183c)
1) 헤라클레이토스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179c-181b)
2) 헤라클레이토스에 대한 비판(181b-183c)
(9) 테아이테토스의 첫 번째 정의에 대한 비판(183c-186e)
2. 앎에 대한 두 번째 정의 : 앎은 참된 판단이다.(187a-201c)
(1) 두 번째 정의의 도입(187a-187d)
(2) 거짓된 판단의 가능성에 대한 이분법적 난제들(187e-189b)
1) 첫 번째 난제: ‘앎과 알지 못함’의 난제(187e-188c)
2) 두 번째 난제: ‘있음과 있지 않음’의 난제(188c-189b)
(3) 난제에 대한 대안들(189b-200d)
1) 첫 번째 대안: ‘착오 판단’의 모델(189b-190e)
2) 두 번째 대안: 밀랍 서판의 모델(1...【작품 개요】
A. 도입부의 액자 이야기(142a-143c)
(등장인물: 에우클레이데스, 테릅시온)
B. 액자 내부의 본 이야기(143d-210c)
(등장인물: 소크라테스, 테아이테토스, 테오도로스)
0. 예비적 논의(143d-151d)
(1) 액자 내부의 도입부(143d-145c)
(2) 앎에 대한 예비적 정의의 시도와 이에 대한 비판(145c-148e)
(3) 산파의 비유(148e-151d)
1. 앎에 대한 첫 번째 정의 : 앎은 지각이다.(151d-186e)
(1) 테아이테토스의 첫 번째 정의와 프로타고라스의 인간척도설의 도입(151d-152c)
(2) 비교(秘敎)로서의 프로타고라스의 학설(152c-160e)
1) 헤라클레이토스적 학설의 소개 및 예비적 정당화(152e-153d)
2) 헤라클레이토스적 학설이 함축하는 놀라운 측면들(153d-155c)
3) 헤라클레이토스적 지각설의 체계적 적용(155c-157c)
4) 예비적 비판을 통한 헤라클레이토스적 지각설의 극단화(157c-160e)
(3) 프로타고라스를 곱씹어 보기(160e-168c)
1) 프로타고라스에 대한 예비적인 문제제기(160e-163a)
2) 프로타고라스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변호 논변(163a-168c)
(4) 프로타고라스에 대한 첫 번째 실질적 비판(168c-171d)
: 프로타고라스에 대한 변증적(대화적) 자기 논박
(5) 정의(正義)의 문제와 관련해서 변형된 프로타고라스주의(171e-172b)
(6) 여담(곁가지 이야기)(172c-177b)
: 연설가의 삶과 철학자의 삶의 대조
(7) 프로타고라스에 대한 두 번째 실질적 비판(177b-179b)
(8)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유전설에 대한 비판(179c-183c)
1) 헤라클레이토스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179c-181b)
2) 헤라클레이토스에 대한 비판(181b-183c)
(9) 테아이테토스의 첫 번째 정의에 대한 비판(183c-186e)
2. 앎에 대한 두 번째 정의 : 앎은 참된 판단이다.(187a-201c)
(1) 두 번째 정의의 도입(187a-187d)
(2) 거짓된 판단의 가능성에 대한 이분법적 난제들(187e-189b)
1) 첫 번째 난제: ‘앎과 알지 못함’의 난제(187e-188c)
2) 두 번째 난제: ‘있음과 있지 않음’의 난제(188c-189b)
(3) 난제에 대한 대안들(189b-200d)
1) 첫 번째 대안: ‘착오 판단’의 모델(189b-190e)
2) 두 번째 대안: 밀랍 서판의 모델(190e-196c)
3) 세 번째 대안: 새장의 모델(196c-200d)
(4) 두 번째 정의에 대한 직접적 비판(200d-201c)
3. 앎에 대한 세 번째 정의 : 앎은 설명을 동반한 참된 판단이다.(201c-210a)
(1) 세 번째 정의와 꿈 이론(201c-202d)
(2) 꿈 이론에 대한 비판(202d-206b)
1) 부분과 전체의 딜레마를 통한 비판(202d-205e)
2) 경험적 사례를 통한 비판(206a-206b)
(3) 설명에 대한 해석: ‘설명’의 세 가지 의미와 난관(206c-210a)
4. 결말 ? 정의(定義)의 실패(210b-210d)
【등장인물】
에우클레이데스
기원전 약 450년~365(?)년. 우리한테 익숙한 수학자 에우클레이데스(보통 ‘유클리드’로 불림)와는 동명이인. 메가라 출신의 철학자. 그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메가라학파의 창시자였다. 후대의 키케로는 그가 엘레아의 일원론 전통을 이어 간 사람이라고 전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가 제시한 학설이 무엇이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테아이테토스》 극(劇)중에서는 테릅시온과 함께 대화편의 본 대화를 유도하는 도입부 대화를 나누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두 사람의 극중의 대화 시점을 기원전 391년쯤으로 잡을 경우에는 50대 후반의 나이가 되지만, 기원전 369년으로 잡을 경우는 81세가 된다. 여기서는 후자로 잡는다.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에 따르면 그가 여섯 편의 대화편을 썼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없다.
테릅시온(Terpsion)
에케크라테스는생몰 연대 미상. 《파이돈》 59c를 보면 에우클레이데스와 함께 소크라테스가 갇혀 있던 감옥에 찾아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메가라학파 초기의 일원이었던 것 같다. 소크라테스가 죽을 무렵(기원전 399년) 에우클레이데스가 50대 초반이었으나 테릅시온의 정확한 나이는 알 수가 없다. 소크라테스가 임종할 때 테릅시온도 함께 참석한 것을 보면 그가 메가라학파를 세우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테아이테토스》의 액자 이야기를 주도하는 것은 에우클레이데스이며, 테릅시온의 역할은 보조적인 데 머문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에우클레이데스가 테릅시온보다 연장자인 것으로 잡고 테릅시온은 에우클레이데스를 추종하는 인물로 설정했다.
소크라테스
기원전 469년~399년. 아테네의 정남방에 위치한 알로페케 구(區) 출신이다. 그의 아버지는 소프로니코스, 어머니는 파이나레테로 알려져 있다. 소크라테스는 중무장 보병으로 세 번에 걸쳐 전쟁에 출정할 때를 빼고는 아테네 밖으로 나가지 않고 언제나 아테네의 청년들과 대화를 즐기며 평생을 살았다. 《테아이테토스》에서도 이 같은 소크라테스의 특징이 잘 묘사되고 있다. 극중에서 소크라테스의 나이는 그의 말년인 70세(기원전 399년)로 확정할 수 있다. 대화편 끝머리(210d)를 보면 멜레토스(Mel?tos)의 공소 때문에 사전 심리를 받기 위해 ‘왕의 회랑’에 출두해야 한다는 언급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 소크라테스
기원전 420년~360년.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와 동명이인이다. 《테아이테토스》 147d에서는 테아이테토스와 함께 무리수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시도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플라톤의 《열한째 편지》 358d에도 등장하는데, 이를 보면 그는 아카데미아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것이 확실한 것 같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 1036b25에서 젊은 소크라테스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을 남기고 있기도 하다. 《정치가》에서는 엘레아에서 온 손님의 주된 대화 상대자로 등장하지만, 《테아이테토스》에서는 대화의 장에 참석했다는 것만이 명시적으로 제시될 뿐 직접 대화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테아이테토스
기원전 약 414/415~기원전 369(?). 아테네 출신의 기하학자로 이 대화편의 주된 화자이다. 그는 에우클레이데스의 《원론》 X권의 토대가 되는 무리수 이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다면체에 대한 연구로 입체기하학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테아이테토스》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테오도로스의 제자였다. 그의 사망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논쟁이 진행중인데, 기원전 391년쯤으로 잡을 경우에는 24세 정도에 사망한 것이 되고, 기원전 369년으로 잡으면 46세 정도에 사망한 것이 된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그가 수학사에 업적을 남긴 인물로 전해지는 것을 고려해서 후자의 연도를 신뢰하는 편이다. 그리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아마 그는 아카데미아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것 같다. 플라톤이 《테아이테토스》에서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어 테아이테토스의 자질을 극찬하는 것을 보면, 플라톤은 테아이테토스의 죽음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였던 것 같다. 우리의 대화편에서는 대략 16살 정도의 나이로 등장하며, 《소피스테스》편에서도 주요 대화자로 등장한다. 그러나 《정치가》에서는 함께 자리에 있기만 할 뿐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
테오도로스(Theodoros)
기원전 약 470~기원전 약 390. 퀴레네 출신의 수학자. 《테아이테토스》에서 나오듯이 테아이테토스의 스승이었으며, 플라톤에게도 가르침을 주었던 것 같다. 프로클로스(Proklos)가 전해주는 바에 따르면 에우데모스의 《기하학의 역사》는 테오도로스가 키오스(Chios)의 히포크라테스(Hippokrat?s)와 동시대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프로클로스,《유클리드의 〈원리들〉1권 주석(In Primum Euclidis elementarum librum commentarii)》, 65.21-66.7 참고). 여기서는 테오도로스의 생몰 연대를 키오스의 히포크라테스와 비슷한 시기로 잡았으며 이에 따르면 대략 기원전 480년에서 기원전 470년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테오도로스가 480년에 태어났다면 소크라테스보다 10살쯤 위인 셈이고 470년에 태어났다면 1살쯤 위인 셈이다. 그런데 우리의 대화편 《테아이테토스》를 보면 테오도로스가 프로타고라스의 제자였다가 프로타고라스가 죽고 나서부터 기하학의 길로 들어섰다고 하고 있다. 프로타고라스의 생몰 연대와 관련해서도 세부적으로는 논란이 많지만, 대체로 기원전 490~420년으로 잡고 테오도로스가 제자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테오도로스의 출생 연도를 480년보다는 470년에 가까운 시기로 잡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물론 적잖은 학자들이 테오도로스가 소크라테스보다 젊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그런 추측은 《테아이테토스》에서 테오도로스가 자신이 노령임을 강조하는 분위기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146b, 162b, 177c 참고). 이런 점에서 앞서 옮긴이가 추측했듯이, 테오도로스의 연배는 소크라테스보다 최소한 한 살 이상 연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듯하다. 이에 따라 이 번역서에서는 소크라테스와 테오도로스가 상호 존대를 하되, 테오도로스가 나이가 위인 만큼 소크라테스가 테오도로스를 칭할 때는 ‘선생’이란 호칭을, 테오도로스가 소크라테스를 칭할 때는 ‘당신’이란 호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테아이테토스》 이후에 쓰인 《소피스트》와 《정치가》에도 테오도로스가 등장한다.
프로타고라스(Pr?tagoras)
기원전 약 490 기원전 약 420년.《테아이테토스》의 극중 시점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제시되기에 실제로는 극중 등장인물이 아니지만, 워낙 중요한 인물로 거론되기 때문에 따로 소개한다. 그는 압데라(Abdera) 출신의 유명한 소피스트이다. 그는 그리스 전 지역을 돌아다니다 페리클레스의 초대로 아테네에 왔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의 식민지 투리오이(Thourioi)의 입법을 해달라고 그를 초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마도 그는 아테네에서 연설기술을 가르치며 사십 년 이상을 거주했던 것 같다. 《프로타고라스》와 《테아이테토스》라는 두 대화편에서 프로타고라스가 주제화되고 있는 것을 볼 때, 플라톤은 그를 소크라테스와 대비되는 주요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런데 플라톤의 《메논》 91e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돈을 받고 가르침을 전한 것으로 유명하며, 이런 주제가 《테아이테토스》에서 논의되기도 한다. 그의 저술은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이 없고 단편으로만 전승되고 있는데, 신의 존재에 대한 불가지론을 내세운 《신들에 관하여》를 썼다고 전해지며, 《테아이테토스》에서 소개되듯 인간척도설을 제시하는 《진리》라는 책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견해가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에서 제시되는 정치철학적 ‘긴 연설’과 어떤 연관을 가지는가는 언제나 큰 논란거리이다. 프로타고라스는 등장인물인 테오도로스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프로타고라스’에 대해서는 ‘님’이란 존칭 표현을 덧붙이기로 한다.
- YES24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