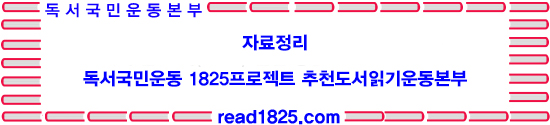7월의 추천도서(2694) 한국병합 110년만의 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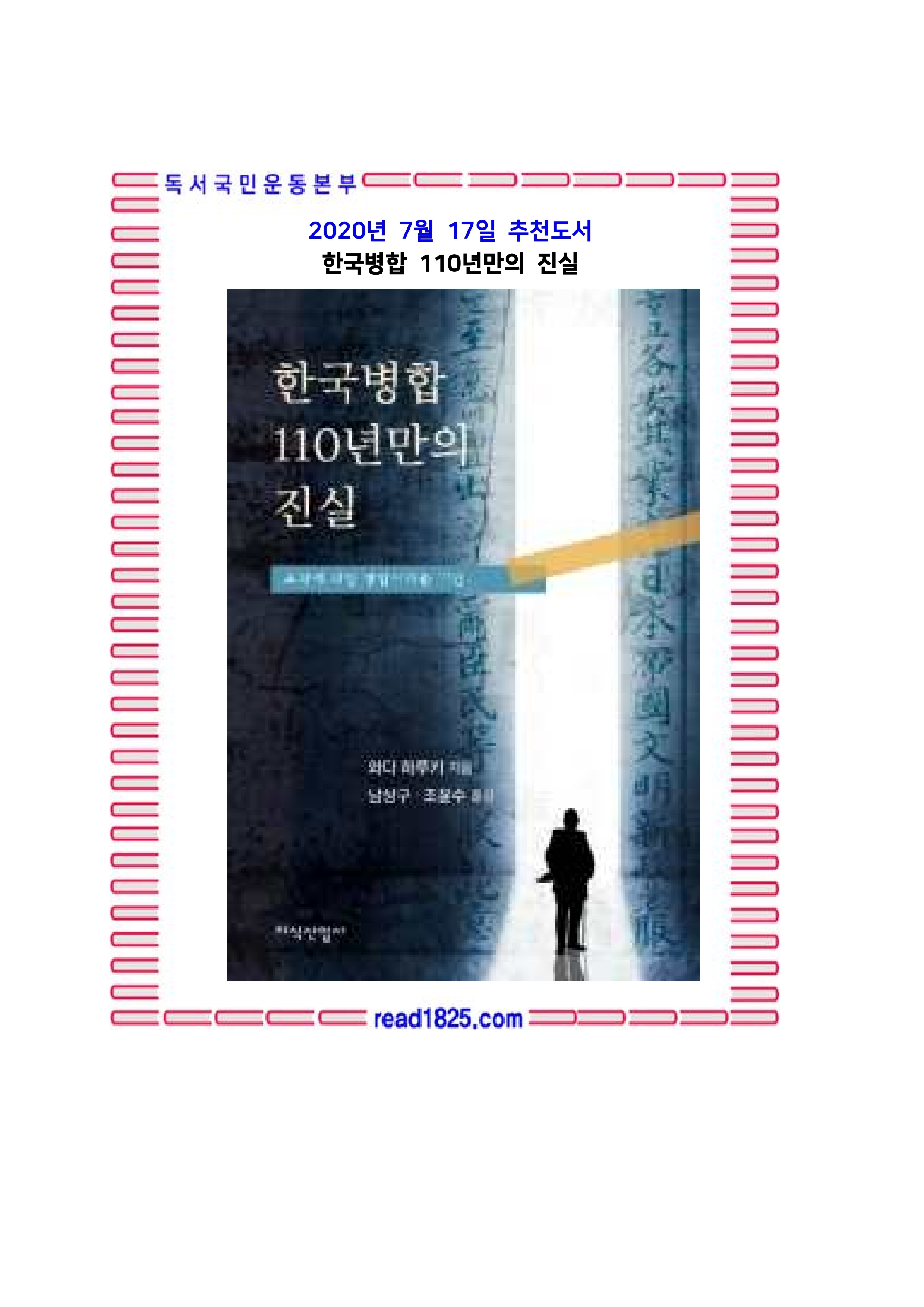
1. 책소개
세계적인 일본의 양심, 한국병합 유효론에 제동을 걸다
동북아시아사 역사학자이자 시민 운동가로서 문제의식의 집약이자 병합론의 종결판
병합 과정으로 보는 제국주의 침탈, 그 흑막의 미스터리
일본의 “행동하는 지성” 와다 하루키 교수가 한국병합 조인 과정의 기망欺罔을 파헤친 저서를 내놓는다. 1965년 한일조약 반대 운동에 참여한 이후 학술과 시민운동을 병행해 온 그가 이번엔 한국병합 원천 무효의 증거를 본격적으로 추적한다. 동북아역사재단 남상구·조윤수 위원의 세심하고도 매끄러운 번역은 함축적인 저자의 필치에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린다.
출처:교보문고
2. 저자
저자 : 와다 하루키

和田春樹
1938년 오사카 출생. 동경東京대학 문학부 졸업. 동경대 사회과학연구소 교수,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등 역임. 현재 동경대학 명예교수. 전공은 소련·러시아사, 한국 현대사.
한국에서 출간된 주요 공·저서로는 《역사가의 탄생》, 《한일 역사문제의 핵심을 어떻게 풀 것인가?》,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북한 현대사》, 《한일 100년사》, 《위안부 합의 이후 한일관계》,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 《러일전쟁-기원과 개전(1·2)》 등 다수가 있다. 일본에서는 《‘평화국가’의 탄생-전후 일본의 원점과 변용》, 《어떤 전후정신의 형성 1938-1965》, 《러시아혁명-페트로그라드 1917년 2월》, 《스탈린 비판 1953~56년-일인 독재자의 사망이 어떻게 20세기 세계를 뒤흔들었나》 등을 출간하였다.
출처:교보문고
3. 목차
한국어판 서문 ㆍ5
시작하는 글 ㆍ15
제1장 러일전쟁 후 일본의 한국 지배 ㆍ25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든 일본 ㆍ27
보호국이란 ㆍ28
러시아 정부의 새로운 방침 ㆍ31
러일협상 조인 이후 ㆍ35
제2장 일본 정부의 병합 단행 시정방침 결정 ㆍ39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병합 ㆍ41
고무라의 병합 의견서 ㆍ43
보호국화도 통고로 실시할 생각이었던 고무라 ㆍ47
보호국화에서 병합으로 이어진 일반 사례 ㆍ49
고무라의 조칙병합안 ㆍ50
가쓰라의 조약병합안 ㆍ55
가쓰라안의 저변에 깔린 한국 정세 인식 ㆍ58
제3장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등장 ㆍ61
데라우치·야마가타·가쓰라 협의 ㆍ63
데라우치 통감 공무 시작 ㆍ68
제2차 러일협약 체결 ㆍ73
조약병합의 기만성 ㆍ75
제4장 병합의 실시 과정 ㆍ79
데라우치 통감의 부임 ㆍ81
황제 순종과 한국 정부 대신들 ㆍ82
데라우치, 조약병합을 요구 ㆍ87
데라우치, 조약문과 전권 위임의 조칙문을 건네다 ㆍ95
한국 대신들의 태도 ㆍ99
데라우치, 조약의 재가를 본국에 요청 ㆍ104
8월 22일 병합조약 조인의 날 ㆍ105
한국황제의 조칙 문제 ㆍ114
제5장 병합의 선포 ㆍ123
천황의 병합조서 ㆍ125
고무라 외상의 병합 발표 ㆍ132
병합의 반향 ㆍ133
9년 후 ㆍ139
나가는 글 ㆍ143
역자의 말 ㆍ145
저 · 역자 소개 ㆍ151
인물 및 단체 설명 ㆍ153
출처:교보문고
4. 출판사서평
국제 정세와 일본의 움직임
제1장의 도입문은 러일전쟁이 대한제국을 겨냥한 것이었음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일본은 러일전쟁 이후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대한제국을 실질적으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없는” 보호국으로 전락시켰다. 일본은 국제정세를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기민한 외교술을 발휘하여 한국을 식민지로 만드는 수순을 밟았다. 이른바 ‘동아시아의 제국주의 분할’ 흐름에 편승한 것이다. 처음에는 중립안을 지지했던 이즈볼스키 러시아 외상이 내몽골에 대한 특수이익을 인정받으면서 일본의 침략 야욕을 묵인한 것은 당시 제국주의 열강의 민낯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병합 주체와 과정에 드러난 모순과 기만
저자에 따르면, 병합의 방식을 놓고 일본에서는 고무라 외상의 조칙병합안과 가쓰라 수상의 조약병합안의 두 가지 안을 저울질했다. 이 가운데 안중근 의거 이후 신중론이 대두되면서 조약병합안이 최종 채택된다. 정략政略과 군략軍略을 겸비한 최고의 군 전략가 데라우치는(정일성, 《인물로 본 일제 조선지배 40년》) 1910년 4월 통감으로 내정되고는 구체적인 병합 추진 계획을 짜고 승인까지 받은 다음 서울에 왔다. 그가 이완용에게 건넨 〈전권위원 위임 조칙안〉은 한국 황제가 아닌 통감 자신이 작성한 것이며, 순종 서명 이후 데라우치가 승인을 했다. 저자는 데라우치가 천황의 〈병합조서〉에도 육군대신으로 연서한 것을 “1인 3역(일본의 대표자, 한국 정부의 외교·내정의 책임자, 육군대신)의 데라우치 1인극의 완성”이라고 폭로한다. 이완용은 대한제국의 총리대신으로서 〈병합조약〉에 서명하였으나 모두 통감의 명령, 지시에 따랐으므로 그의 대리인, 괴뢰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서명 위조 행위나 바꿔치기 등 조약 형식과 체결 절차상의 결함을 들어 병합 무효론을 제기한 이태진 교수의 지적(《일본의 한국병합 강제 연구》)을 더하면, 결국 한국병합이란 일본제국이 한국 황제에게 병합을 강요하여 체결한 기만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병합 무효론에 대해서 운노 후쿠주, 햐쿠타 나오키 등 일본 주류학계에서는 한국병합 조약의 법적 유효론을 고수한 채, 한일조약 제2조의 해석 차이를 방치하고 있다. 그러나 110여 년이 지난 뒤에도 그에 따른 상흔과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미궁에 빠져 있는 이 형국은 어느 것이 맞는지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막이 내린 후
데라우치 통감이 술자리에서 노래를 부를 때까지만 해도 연극은 성황리에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는 러시아 전함의 침몰 때 사네유키의 독백(《언덕 위의 구름》)처럼 신기루 같은 성공의 허망을 그때에는 아마도 몰랐을 것이다. 한국병합 110년이 지난 지금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다. 7년 전 저자가 한일공동성명에서 제시한 네 가지 과제는(김영호·와다 하루키 외, 《한일 역사문제의 핵심을 어떻게 풀 것인가》)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저자는 두 나라 역사 인식 대립의 원천인 병합을 직시하면서, 제2조에 대한 한국 측 해석 채택이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80년 간 전쟁’에 시달린 동북아에서 새로운 ‘공생’의 길이 열릴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의 몫일 것이다.
출처:지식산업사